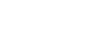사전적 의미로의 한 세대는 30년을 말한다.
그러나 그런 정의는 제껴두고, 내게있어 한 세대는 나와 10년 나이차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정서적 동질감을 일컫는 말이다.
발걸음을 일절 안했던 페북에 며칠 전 왜 그렇게 들어가보고 싶었는지.
그리울만 하면 어김없이 전화 너머로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그날 쓰셨던 문장이나 하나의 영감을 두고 이런저런 의견을 나누거나 가끔은 나 사는 이야기도 담담히 들어주시고 마치 우리 한 세대의 하늘이 부드럽고 붉게 넘어가듯 아름답게 살아있음을 상기시켜주던 분.
그래, 내가 아직도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 시를 끄적이고 이미 늦어버린 발등에 떨어진 불 꺼보려 허둥지둥거려도, 그래도 힘을내서 세상에 얼굴을 디밀고 알짱거렸던 것은 다 내 세대가 아직 죽지않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 분이 내 한참 앞서서 아직 힘차게 길을 가고 세상을 주유하고 있어서. 아직도 내가 희망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줘서.
그래 나 아직 늦은게 아니지?
스스로에게 물음이 생길 때마다 자신있게 해답으로 떠올리던 분.
근데… 그런 분이 거목이 눕듯 쓰러지셨다.
.
어제 나는 스물일곱에 요절한 나를 조문하고 왔네. 꽃 같은 얼굴이 웃고 있는 영정 앞에 예를 갖추고 향을 피우고 한 송이 애도를 놓고 왔네. 나는 나의 빈궁한 유배처, 나의 고적한 유적지, 불탄 폐사지, 내가 나를 답사하고 탐사 중이네. 휘돌며 흰 보선발을 들어 춤도 춰보네. 나는 파장한 거리의 불 꺼진 상점들. 나는 나의 목 쉰 장사치. 나는 나의 홍등가. 내가 나의 창부, 거간꾼이라네. 그렇다면 나여. 끝내 나의 무엇으로 나는 남으려는지? 나는 나의 번다한 그 모든 혼란과 혼돈. 일생 나를 따라다니며 명치끝을 건드리는 생각이라는 뿔로 한 줄 문장을 쓰는 나는 고작 나의 가냘픈 질서, 나는 오늘도 문득, 태어난 일의 기적을 사네. 나라는 가능성을 사네.
둑길에는 어린 산사나무가 한 광주리 꽃을 피웠네. 산사나무라는 해당화라는 이름에 묶인, 나무라는 꽃이라는 색(色)의 배열을 지나네. 몇 걸음 가다보니 못다 핀 꽃망울이 달린 채 부러진 꽃가지가 던져져 있네. 나는 찢겨져나간 나를 지나치지 못하네. 꽃가지를 주워 둑길을 걷네. 지난해 봄빛이 되비치는 둑길, 나는 나의 전생과 후생을 주워 둑길을 흘러가네. 빛과 그늘이 출렁이는 유리, 혹은 유리의 안쪽을 물고기들의 유영처럼.
.
천천히 나지막한 소리로 저 문장을 따라가다보면, 슬프고 휘황하고 아름다운 그 부질없는 꿈에 취해 허우적거린다.
어눌해지고 느릿느릿해진 선생님의 목소리를 폰 너머로 들었을 때, 속이 상해서 울컥 눈물이 쏟아졌다.
분명 조만간 다시 일어서실 것을 믿지만
나의 세대가 마침내 넘어가버렸다는 것 때문에.
나도 이렇게 스러져버릴지 모른다는 서글픔때문에.
문득 암전되어버린 듯 해답이 사라져버린 내 가늠할 수 없는 꿈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