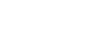중독자(中毒者)
천수호
그는 술상을 책상으로 바꾸는 재주가 있다
이만하면 되겠지?
그는 술상에다 내 앉은키를 맞춰보았다
나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나무 빗장처럼 몸이 쉽게 들락날락했다
이만하면 몸에 잘 맞겠지?
잔뜩 신이 났다
연장이 다 있으니
술상을 책상으로 고치는 것쯤은 문제가 아니야
나는 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격자무늬를 넣고 말간 유리까지 얹겠다고 했고
나는 앉은뱅이라도 좋으니 들어앉기만 하면 좋겠다고 했다
열흘이면 될까 한 달이면 될까
가늠하는 날은 그리 멀지 않았으므로
아직은 배를 깔고 엎드려 책을 읽어도 좋았다
한 계절이면 될까 일 년이면 될까
연장을 써본 적 없어서
한 날 한 날의 대패에 밀리는 날이 길어졌다
유리와 격자무늬 사이엔 하얀 창호지를 깔고
책을 읽다 심드렁해지면 시도 한 편 써봐야지
빈 혀의 맹세를 깨물고 침 흘리며 잠든 날이 많아졌다
술과 책은 편백나무 상 위에서 오래 삐걱거렸다
입술만 둥둥 뜬 술책은 다시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는 책으로 술을 빚는 재주가 있었다
천수호
1964년 경북 경산 생.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문예창작).
2003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시집 – 『아주 붉은 현기증』 『우울은 허밍』 『수건은 젖고 댄서는 마른다』
이 시가 실린 시집 구매
애초 술상이 따로 있을라고. 묵직한 좌탁에 술 받쳐놓고 허구헌날 홀짝거리면 그게 술상이지. 옛날엔 책상 없으면 좌탁에 책 놓고 글도 읽고, 때 되면 밥하고 찬 올려놓고 둘러앉아 대가리 부딪혀가며 끼니 때우고 그랬잖아. 밥그릇 싸움에 지면 구석에서 두 손 들고 그렁그렁한 눈물만 떨궜고. 좌탁이 책상이 되느냐 밥상이 되느냐 술상이 되느냐는 순전히 그 집구석 수준인거지.
근데 내 집구석에 들어온 좌탁은 아예 술받이야. 얘가 툭하면 정신줄을 놓는거야. 안주들과 한 몸이 되어 훽 뒤집혀있지를 않나. 박살난 소주병, 노가리, 땅콩, 풀어진 헹주 잔뜩 뒤집어 쓰고 부엌 구석에 나뒹굴고 있질 않나. 지긋지긋한 친정을 벗어났나 싶었더니 이젠 징글징글한 진창 속이네.
그 술상 뒤엎은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 비틀 날 바라보는 눈알 촛점이 따로 놀면 무조건 밖으로 내빼야 해. 그땐 그 인간이 웃거든. 실실 웃어. 그럼 그 안에 딴 놈이 들어온거야.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수도없이 사정을 했지. 밤에 놀이터에서 혼자 울었던 날도 많아. 내 속은 진짜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도 말술일까. 말수 없고 착해서 술만 안먹으면 세상없는 인간인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첨에 선보고 나서 두 번짼가… 나 한테 술 따라 주는데 손을 달달 떨더라고. 오모나, 이런 기념물같은 놈이 아직도 세상에 있나 싶었지. 내가 미쳤어, 그때 이미 술에 찌든 몸뚱인데… 내 눈깔 내가 팔 수도 없고. 폭폭하면 내가 가끔 악을 써. 울기도 하고. 한번은 진짜 끝장을 내버리려고 가방을 쌌지. 나 정말 안살라고 그랬어. 미정이네로 들어가서 아주 잠적을 해버렸지. 이 화상이 얼마나 친정에 들락거렸는지 울 엄마가 전화로 사정을 하더라니까. 김서방 정신 돌아왔다고. 엄마만 안아프면 두 번 다시 안보려고했는데. 저러다 나 때문에 돌아가시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
암튼 변하긴 변했나? 내 눈치를 살살 보거든. 안그러던 사람이 그러니까 쫌 이상해. 그래도 그놈의 술은 손절을 못해. 식탁 구석서 홀짝거리더라고. 덕분에 좌탁은 내 차지야 요새. 그나마도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나 어려서 꿈 알잖아. 시 쓰고 싶었던거. 책상으로 써야지 싶어 작은 화분도 사다놨어. 빨갛고 노랑 다육이로 하나씩. 인간이 책같은 거 좀 좋아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난 없이 살아도 있지 정신적으로 꽉 찬 남자가 좋아. 아 참, 내 정신 좀 봐. 그 인간 들어올 시간인데.
참, 경희야, 너 언제 한번 나 공부하는데 나와. 너도 글쓰고 싶댔잖아. 이번에 선생님 바뀌는데 남자야, 남자!
내 마누라는 술로 치면 빼갈이지. 한 번 넘기려면 천불나고 넘기고 나면 묵직하니 따숩거든. 난 술을 마실 때마다 마누라 생각해. 아름답지. 앙탈하는 그 몸 위에서 출렁거릴 때. 우리가 취할 때. 뭔가를 쓰고 난 밤의 그녀는 더 말을 해. 앙다문 입술 틈으로 새어나오는 말들. 흐느적거리는 말들.
나는 그녀를 위해 술상을 깎을 생각이야. 공부한다는 데 술 기운은 걷어내줘야지. 술독에서 글을 쓴다면 취해서 비틀거리는 글 뿐일테니. 격자무늬를 넣고 말간 유리까지 얹어줘야지. 고치는 건 일도 아니지. 일주일이면 되지 열흘까지야. 팔짝 팔짝 뛰면서 좋아하더군. 해바라기같더라고. 그리 환하게 웃어주니까 해가 한 달치는 거실에 쏟아진거 같더라고.
7일을 이 날 저 날 사이에 슬쩍슬쩍 끼워넣었지. 술상을 깎는데 취기가 깎이더라고. 그 달콤하고 그윽하고 쓰디 쓴 즐거움. 그게 깎여나가는 게 섭섭해 딱 한 잔 뱃 속에 넣어줬지. 확 올라오는 그 몽롱한 걸 어디에서 얻어, 그걸. 난 딱 한 잔씩만 했지. 딱 한 잔. 한 잔 하고 나면 봄이가고, 또 한 잔 하고 나면 초여름이고, 세상이 온통 찬란하고 어질어질한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딱 한 잔 하고 나니 여름이 서늘해지고 있더군.
여기를 이렇게 깎으면 되겠군, 나의 혀는 벌써 술상을 여러 번 깎고 있었지. 가을이 가기 전엔 다듬을거야. 울긋불긋한 취기를 꽉 잡고, 마누라가 쓴 시를 읽으면 기가 막힐거야. 마누라도 한 잔 먹이지 뭐. 딱 한 잔. 알딸딸하니 시를 쓰면 얼마나 어질어질한 시가 나올까. 술 없는 시가 어디 시야?
한 잔 씩 마시고 우리는 또 사랑을 해야지. 가을이 가고 겨울이 지나갈거야. 깨보면 봄이고 깨보면 또 여름이겠지. 술이 술을 마신건지 시가 술을 마신건지 내가 시를 마신건지 마누라가 세상을 마신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겠지.
술상을 다듬어 줘야 할텐데…… 술이 똑 떨어졌군. 딱 한 잔만 하고 시작해야겠네. 딱 한 잔만.